일상적인 것들에 스며든 당신의 숨결
김명기
218.♡.187.31
2004.07.12 10:00
1,623
6
0
0
본문
일상적인 것들에 스며든 당신의 숨결
어느 순간엔가 모든 것이 딱 멈추어 있는 것을 알았다. 나는 2년이나 지난 BAZAAR 지를 읽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 잡지에 시선을 두고 있지만 유리알 이라도 되어 버린 것처럼 눈동자는 단 한 줄도 읽지 않고 있었다.
또 다른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카페의 실내에 흐르던 Keith Jarrett의 음악도 멈추어 있고 공기의 흐름 같은 것도 완전히 정지 되어 있어, 어쩌면 시간도 멈추어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고전적인 연극의 팸플릿 따위에 2차원으로 인화되어버린, 시간을 뽑아내어 생기라곤 조금도 남지 않고 사라진 흑백의 인물사진으로 변한 것일지도 모르지. 죽음, 또는 정물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일까?
몸속의 모든 것들도 모조리 굳어져 버리고 나는 이미 무생물인 것 같은 딱딱한 느낌을 갑자기 견딜 수 없었다. 뭔가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인 것 같다. 움직이지 않는 것들의 감옥. 어깨를 짓누르는 시간의 무게. 나는 재빨리 냉장고로 걸어가서 말린 옥수수와 김 두어 장, 그리고 맥주 한 병을 쟁반에 받쳐 들고 책상으로 돌아왔다. 걸음걸이가 오일이 말라붙은 버려진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처럼 부자연스러웠다. 어디선가 우드득! 거리는 소리도 조그맣게 들리는 것 같았다. 세상은 끝없이 마린블루로 굳어져 간다.
투명한 잔에 가득히 옐로우오우커의 맥주를 붓고 “싸아아...” 하는 오래된 녹음테이프에서 들리는 것 같은 작은 파도 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목이 따갑도록 욕심내어 마신다. 어쩐지 미네랄 가득한 새롭고 상쾌한 세계가, 나의 몸속으로 퍼져 나간다. 맥주잔에서 품어 올라오는 기포 하나하나가 몸 안에서 작은 크루즈 미사일이 되어, 정확하게 우울이나 고민 따위의 목표물을 찾아 폭파하는 불꽃으로 생기 넘치는 지옥, 아수라장을 만드는 것이다.
“나 맥주 별로 안 좋아 하는데 이상하게 당신과 마시면 뭔가 굉장한 것을 마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참을 수가 없어요.” 립스틱을 지운 연한 핑크의 입술에 하얀 거품을 잔뜩 묻힌 채, 고개를 5도쯤 왼쪽으로 갸웃 기울인 채 물속에서 공기방울을 품어 내는 열대어처럼 싱싱하게 말하는 당신이 떠올랐다. 정수리에서 쏟아져 내리는 조명은 당신의 창백한 목을 날카로운 선으로 구분 짓는다. 초콜릿 같은 얼굴의 그림자와 우유같이 말갛게 빛나는 부드러운 어깨. 지직스(ZZYZX) 였었던가? 나는 조금 더 진한 파란 색으로 허물어져 간다.
밤이 유리창에 비친 가로등처럼 둥둥 떠간다. 너무 많이 마신 것일까? 귓바퀴가 하얗게 빛나던 탐스런 귀에 걸린 반짝이는 귀걸이를 닮은 별들이, 검은 그림자가 되어버린 산머리에 흩어져있다. 피리소리 같은 밤이다. 왜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인지는 나도 모른다. 그냥 피리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안개처럼 깔려있는 달콤한 밤이다. “아이 어딜 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 좀 보래니까요.” 당신의 음성이 피리소리를 닮았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텅 빈 밤하늘에서 당신의 귀걸이 같이 찰랑거리는 별을 볼지도, 피리소리 같은 적막 속에 혼자 정물이 되어 놓여질 지도 몰랐다. 그 아름다운 밤에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었다. Blackmore's Night 가 Ocean Gypsy라고 덜 잠그어 진 싱크대의 수돗물처럼 속삭인다.
사랑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무엇인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어둠은 배 한척 없는 항구가 되고, 떠나고 싶은 마음만 해변의 바위에 좌초된 낡은 나룻배가 되어 파도소리 속에 잠들지 못하고 서성인다. 그래 어디로 떠나고 싶은 것인가? 바다에 비친 달을 따라? 죽어도 가라앉지 않을 가슴 속의 그리움을 따라? 백만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당신의 미소 한 조각을 따라? 바위틈으로 사라지는 파란 뱀 꼬리처럼 눈물 한 방울이 심장으로 스며든다.
자야겠다. 샤워나 하자. 샤워를 마치고 아무렇게나 수건을 벽의 수건걸이에 걸쳐 놓고 화장실 문을 걸어 나오다 문득 걸음을 멈춘다. 잠깐 뭔가 잊은 듯 서 있다가 다시 들어가 수건을 마크가 잘 보이도록 정돈하여 걸어 놓는다. “아유이게 뭐예요?” 당신과 함께 일 때는 좀 채로 하지 않던 일들을, 어쩐 일인지 나 혼자인 지금은 당신이 하던 대로 해 놓는다. 가끔 습관은 아주 이상한 경로로 몸에 자리 잡는 것이다.
“음, 아주 잘 했어요. 저녁엔 스테이크 구워 드릴게요. 레어로 말이지요.” 아마 당신은 어린애라도 칭찬하듯 과장되게 입술을 내밀며 내 등을 토닥이겠지. 오늘 같은 금요일 일부러 몇 가지 약속을 취소하고 돌아가는 길은 느리기만 했다. 녹색 곰돌이 에이프런의 밤색 단추를 잠그며 춤추듯 사뿐한 걸음걸이로 주방으로 간 당신은 내가 좋아하던 대로 버터를 엷게 두른 뜨거운 철판에 두텁게 자른 고기를 올려놓아 주었을 것이다.
“치이익!” 주방에선 육즙을 가두는 뜨거운 불길 위에 하얀 수증기와 버터의 강한 향기, 안심이 구워지며 배어 나오는 참을 수 없이 아늑한 향기가 번져 나올 것이다. 하얀 면 셔츠차림의 나는 우리를 위하여 J&B Jet Coke를 준비하고 있겠지. 양송이와 마늘, 데코레이션 할 야채들도 천천히 익어가고, 키 작은 은 빛 촛불은 테라스를 핥고 지나가는 봄바람에 팔랑인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콧등을 따라 흐른다. 현기증처럼 잠깐씩 느닷없이 다가오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에 스며든 당신의 숨결로 술 취한 나의 진공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피리소리 같은 한없이 부드러운 밤. 아직 잠들지 못했다.
강하마을에 머무는 파란 달빛
www.allbaro.com
어느 순간엔가 모든 것이 딱 멈추어 있는 것을 알았다. 나는 2년이나 지난 BAZAAR 지를 읽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 잡지에 시선을 두고 있지만 유리알 이라도 되어 버린 것처럼 눈동자는 단 한 줄도 읽지 않고 있었다.
또 다른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카페의 실내에 흐르던 Keith Jarrett의 음악도 멈추어 있고 공기의 흐름 같은 것도 완전히 정지 되어 있어, 어쩌면 시간도 멈추어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고전적인 연극의 팸플릿 따위에 2차원으로 인화되어버린, 시간을 뽑아내어 생기라곤 조금도 남지 않고 사라진 흑백의 인물사진으로 변한 것일지도 모르지. 죽음, 또는 정물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일까?
몸속의 모든 것들도 모조리 굳어져 버리고 나는 이미 무생물인 것 같은 딱딱한 느낌을 갑자기 견딜 수 없었다. 뭔가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인 것 같다. 움직이지 않는 것들의 감옥. 어깨를 짓누르는 시간의 무게. 나는 재빨리 냉장고로 걸어가서 말린 옥수수와 김 두어 장, 그리고 맥주 한 병을 쟁반에 받쳐 들고 책상으로 돌아왔다. 걸음걸이가 오일이 말라붙은 버려진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처럼 부자연스러웠다. 어디선가 우드득! 거리는 소리도 조그맣게 들리는 것 같았다. 세상은 끝없이 마린블루로 굳어져 간다.
투명한 잔에 가득히 옐로우오우커의 맥주를 붓고 “싸아아...” 하는 오래된 녹음테이프에서 들리는 것 같은 작은 파도 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목이 따갑도록 욕심내어 마신다. 어쩐지 미네랄 가득한 새롭고 상쾌한 세계가, 나의 몸속으로 퍼져 나간다. 맥주잔에서 품어 올라오는 기포 하나하나가 몸 안에서 작은 크루즈 미사일이 되어, 정확하게 우울이나 고민 따위의 목표물을 찾아 폭파하는 불꽃으로 생기 넘치는 지옥, 아수라장을 만드는 것이다.
“나 맥주 별로 안 좋아 하는데 이상하게 당신과 마시면 뭔가 굉장한 것을 마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참을 수가 없어요.” 립스틱을 지운 연한 핑크의 입술에 하얀 거품을 잔뜩 묻힌 채, 고개를 5도쯤 왼쪽으로 갸웃 기울인 채 물속에서 공기방울을 품어 내는 열대어처럼 싱싱하게 말하는 당신이 떠올랐다. 정수리에서 쏟아져 내리는 조명은 당신의 창백한 목을 날카로운 선으로 구분 짓는다. 초콜릿 같은 얼굴의 그림자와 우유같이 말갛게 빛나는 부드러운 어깨. 지직스(ZZYZX) 였었던가? 나는 조금 더 진한 파란 색으로 허물어져 간다.
밤이 유리창에 비친 가로등처럼 둥둥 떠간다. 너무 많이 마신 것일까? 귓바퀴가 하얗게 빛나던 탐스런 귀에 걸린 반짝이는 귀걸이를 닮은 별들이, 검은 그림자가 되어버린 산머리에 흩어져있다. 피리소리 같은 밤이다. 왜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인지는 나도 모른다. 그냥 피리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안개처럼 깔려있는 달콤한 밤이다. “아이 어딜 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 좀 보래니까요.” 당신의 음성이 피리소리를 닮았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텅 빈 밤하늘에서 당신의 귀걸이 같이 찰랑거리는 별을 볼지도, 피리소리 같은 적막 속에 혼자 정물이 되어 놓여질 지도 몰랐다. 그 아름다운 밤에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었다. Blackmore's Night 가 Ocean Gypsy라고 덜 잠그어 진 싱크대의 수돗물처럼 속삭인다.
사랑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무엇인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어둠은 배 한척 없는 항구가 되고, 떠나고 싶은 마음만 해변의 바위에 좌초된 낡은 나룻배가 되어 파도소리 속에 잠들지 못하고 서성인다. 그래 어디로 떠나고 싶은 것인가? 바다에 비친 달을 따라? 죽어도 가라앉지 않을 가슴 속의 그리움을 따라? 백만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당신의 미소 한 조각을 따라? 바위틈으로 사라지는 파란 뱀 꼬리처럼 눈물 한 방울이 심장으로 스며든다.
자야겠다. 샤워나 하자. 샤워를 마치고 아무렇게나 수건을 벽의 수건걸이에 걸쳐 놓고 화장실 문을 걸어 나오다 문득 걸음을 멈춘다. 잠깐 뭔가 잊은 듯 서 있다가 다시 들어가 수건을 마크가 잘 보이도록 정돈하여 걸어 놓는다. “아유이게 뭐예요?” 당신과 함께 일 때는 좀 채로 하지 않던 일들을, 어쩐 일인지 나 혼자인 지금은 당신이 하던 대로 해 놓는다. 가끔 습관은 아주 이상한 경로로 몸에 자리 잡는 것이다.
“음, 아주 잘 했어요. 저녁엔 스테이크 구워 드릴게요. 레어로 말이지요.” 아마 당신은 어린애라도 칭찬하듯 과장되게 입술을 내밀며 내 등을 토닥이겠지. 오늘 같은 금요일 일부러 몇 가지 약속을 취소하고 돌아가는 길은 느리기만 했다. 녹색 곰돌이 에이프런의 밤색 단추를 잠그며 춤추듯 사뿐한 걸음걸이로 주방으로 간 당신은 내가 좋아하던 대로 버터를 엷게 두른 뜨거운 철판에 두텁게 자른 고기를 올려놓아 주었을 것이다.
“치이익!” 주방에선 육즙을 가두는 뜨거운 불길 위에 하얀 수증기와 버터의 강한 향기, 안심이 구워지며 배어 나오는 참을 수 없이 아늑한 향기가 번져 나올 것이다. 하얀 면 셔츠차림의 나는 우리를 위하여 J&B Jet Coke를 준비하고 있겠지. 양송이와 마늘, 데코레이션 할 야채들도 천천히 익어가고, 키 작은 은 빛 촛불은 테라스를 핥고 지나가는 봄바람에 팔랑인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콧등을 따라 흐른다. 현기증처럼 잠깐씩 느닷없이 다가오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에 스며든 당신의 숨결로 술 취한 나의 진공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피리소리 같은 한없이 부드러운 밤. 아직 잠들지 못했다.
강하마을에 머무는 파란 달빛
www.allbaro.com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글이 없습니다.
최신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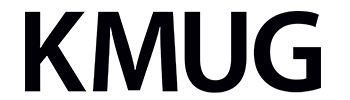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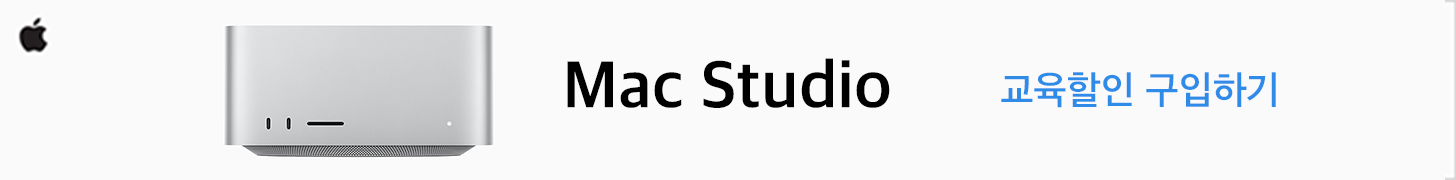


댓글목록 6
adam님의 댓글
- adam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11.♡.60.171 2004.07.12 15:10일상적인 것들에 스며든 당신의 숨결...그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나 봅니다. 잊으려 잊으려 애를 쓰면 더 생생히 살아나는 그런것들...
김명기님의 댓글
- 김명기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18.♡.187.31 2004.07.12 17:04그런데도 사랑 타령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용감한 것 같더군... ^~^
iceberg님의 댓글
- iceberg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20.♡.73.220 2004.07.13 09:35그렇담 역시 사랑은 대단한 것인가보네요. 누구는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때문에 맘 아플일도 힘들일도 없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김명기님의 댓글
- 김명기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18.♡.237.200 2004.07.13 10:18마력! 이라고 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서지고 깨지면서도 그 주변에 머물길 원하니...
하비님의 댓글
- 하비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18.♡.48.67 2004.07.14 10:30좋네요. 모니터에서 냄새가 나는거 같아요. (^^ )
그리고... zzyzx ... 참 좋아하는 곳인데...
아... 오늘 일하기 힘들겠다... 아침부터... 흐~ (^^;)
넘힘든하루님의 댓글
- 넘힘든하루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22.♡.19.80 2007.01.27 16:26어짜피 사랑하는 과정 자체가 누군가를 받아드리는 과정 같습니다.
받아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익혀지는 거겠죠
그렀게 습득된 건 쉽사리 지울 수 없는 것일테구요...